삼성과 북한에는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것 외에도 닮은 점이 하나 더 있다. 한국 사회에서 둘이 갖는 무게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이다.
제프리 케인의 <삼성 라이징Samsung Rising>을 읽으면서 문득 한국에서 나온 삼성 관련 책들이 무엇이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다. 삼성의 경영법이나 이건희 리더십에 대한 낯간지러운 책 아니면 삼성의 지배구조나 경영 악습에 대한 날선 비판의 책들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삼성과 북한에 대해서는 ‘중간’을 찾기 힘들다. 보다 정확하게는 중간을 용인하지도 않는다. (내가 읽은 것 중에서는 2005년에 나왔던 강준만의 <이건희 시대>가 균형을 잡고 있었던 듯한데 이 책은 제목부터 그렇듯 이건희 개인에 집중한 것이다)
이 책이 한국 독자에게 갖는 미덕은 안드레이 란코프가 북한에 대해 한국 사회에게 제공하는 미덕에 견줄 수 있겠다. 란코프가 ‘진영’의 색안경을 벗고 북한을 보여주는 것처럼 케인도 대구의 한 가게로 시작한 삼성이 어떻게 애플과 건곤일척을 벌이게 됐는지를 담담하게 서술한다.
아마도 책을 보기 전에 다들 가장 먼저 가질 의문은 ‘아니 그래도 한국에서 쏟아지는 삼성 관련 기사가 얼마나 많은데 과연 외국인 기자가 쓴 책의 정보값이 얼마나 높을까?’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나는 막상 읽어보면서 우리가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잘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자에게 자유롭게 말을 하는 미국 지사의 전직 임원들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 ‘하드웨어의 삼성’이 미국에서 성공하는 데는 마케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케인의 관점인데 책에서 다루는 사건 하나하나는 물론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던져주는 맥락과 함께 그 사건들을 읽어보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
삼성의 미국 지사와 한국 본사와의 갈등도 그렇다. 이런 갈등 사례에 대한 기사가 한국에서 보도가 안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을 보면 본사의 경직된 문화가 미국에서의 영업 확장에 상당한 걸림돌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다(내 기억으론 당시 한국에서 보도된 내용은 그 반대의 관점이었다). 심지어 본사의 간섭으로 또 망하는 걸 피하기 위해 미국 지사의 임원들이 ‘비밀작전’을 펼치는 사례도 나온다.
책을 읽으며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제국’을 경영하는 한국 조직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나도 역시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다.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갈등을 무엇으로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삼성의 미국 지사와 한국 본사와의 갈등은 일정 부분은 (책에 따르면) 이재용의 리더십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의 앞날은 이재용의 리더십 역량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케인은 여기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진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듯) 케인도 이재용의 능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금기어(?)가 된 e-삼성이야 다들 아는 이야기고… 케인이 전하는 신선한 사례는 롤스로이스의 한국 지부장을 역임했던 앨런 플럼의 경험담이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난 이재용이 에어버스 A380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을 삼성 테크윈이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라는 것.
하지만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재용의 능력을 탓하기는 좀 어려울 듯싶다. 처음에 삼성항공으로 출발했던 테크윈은 IMF 때 항공 부문을 대부분 KAI로 넘기면서 이미 한풀 꺾인 상황이었고 결국 2015년에 한화에 매각된다.
그보다는 이건희가 제시한 것과 비등한 수준의 비전을 과연 이재용이 내놓을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한국 재벌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석이 제시된 것처럼, ‘비전’을 가진 오너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계열사의 수익도 과감히 털어넣는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재용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케인은 여기에 대해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다만 이건희가 소프트웨어 중시를 천명한 데 반해 이재용은 그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중간 중간 남겨놓은 서술은 그가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책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삼성의 미국 마케팅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 삼성이 하드웨어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내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별로 아는 바는 없지만 삼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기술력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의 이야기는 단지 이건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후진 제품으로 본파이어를 했고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테다.
삼성이라는 조직에 대해 기존과 다른 해석을 내놓거나 하진 않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기술된 삼성의 역사를 읽고 나면 각자 맥락을 부여할 수 있는 ‘여유’ 혹은 객관적 거리가 생길 것이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단신들만 읽으면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참고로 이 책은 5월말쯤 저스트북스에서 ‘떠오르는 삼성’이란 제목으로 출간될 예정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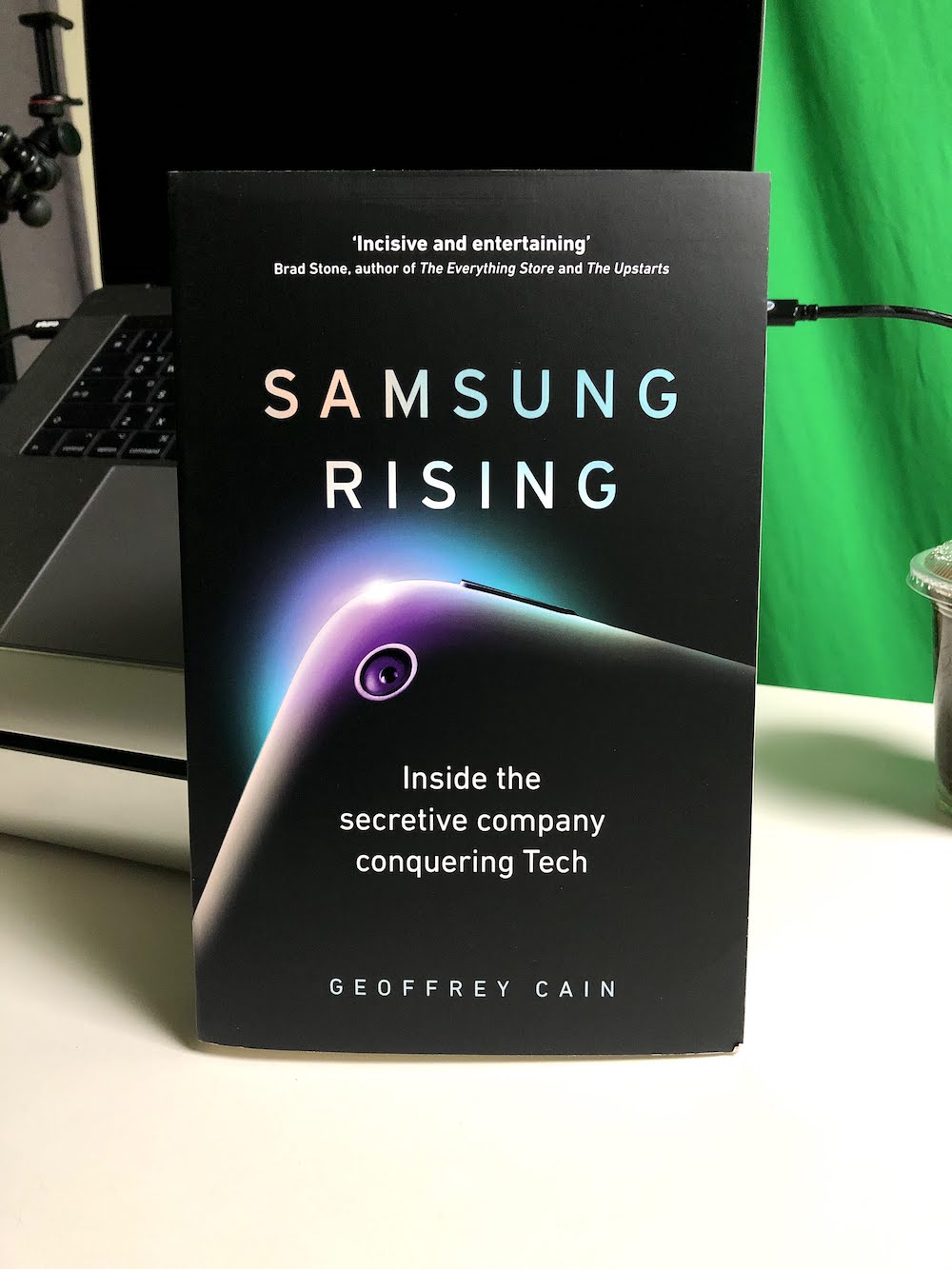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