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윌슨은 자신의 소설창작법 강좌에서 그렇다고 말한다. 반면 찰리 카우프만 은 그런 ‘3막 구조‘ 같은 관념을 극도로 혐오한다. (하지만 카우프만의 대표작 ‘존 말코비치 되기’는 그야말로 가장 클래식한 3막 구조를 따르고 있다.)
‘공식’이란 말 대신 ‘원형’을 써보면 어떨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청중을 가장 감동시키는 이야기에는 공통의 원형이 있다는 것이다. BBC 드라마의 극작가였던 존 요크가 2014년 쓴 Into The Woods는 그 원형을 분석한다.
‘원형’이란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 유명한 3막 구조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시드 필드(1935~2013)가 제창한 것이지만 이것이 보다 세분화된 5막 구조(대부분의 3막 구조 각본도 따져보면 5막 구조에 가깝다)는 테렌티우스(기원전 195~159)부터 셰익스피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구사돼 왔다고 한다.
저자가 현대의 가장 잘 짜여진 극영화의 여러 사례(‘델마와 루이스’와 ‘대부’가 가장 인상적이다)를 갖고 그 안에 숨겨진 5막 구조를 보여주는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이 주는 최고의 미덕은 그런 ‘원형’의 스토리텔링 구조가 왜 독자,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거의)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이 바라는 것want과 필요한 것need 사이의 괴리에서 시작되고 종국에는 그 둘의 결합으로 주인공이 변모하는 변증법적 구조를 갖는다. 이것이 갖는 함의는 생각보다 큰데, 결국 테제 못지않게 안티테제도 강력해야 진테제가 주는 감동이 더 크다는 것이고, 이는 바꿔말하면 히티콕 말마따나 영화의 수준은 영화에 나오는 빌런이 결정한다는 게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보면, 스토리텔링의 ‘유효성’ 자체에 얼마만큼의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그 유효성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일수록) 어떠한 원형이나 공식이 있다는 생각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답이 나와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니까.
콜린 윌슨은 소설가로서의 작법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강한 문제의식, 다시 말해 ‘테마’를 가지고 소설을 써왔다. 저자가 유효한 스토리텔링의 작법을 탐구하는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강조하는 것 또한 테마다. 테마가 꼭 콜린 윌슨의 것처럼 인류 의식의 진화 같이 거창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테마가 없으면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효한 스토리텔링의 청사진이라는 건 (표현방식은 달라도) 늘 존재했지만 이를 위한 캐릭터 설정과 이야기 흐름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테마다. 단 한 권의 책에서 나는 많은 걸 배우고 생각했다. 앞으로 스토리텔링을 기획할 때마다 여러 차례 다시 꺼내 읽게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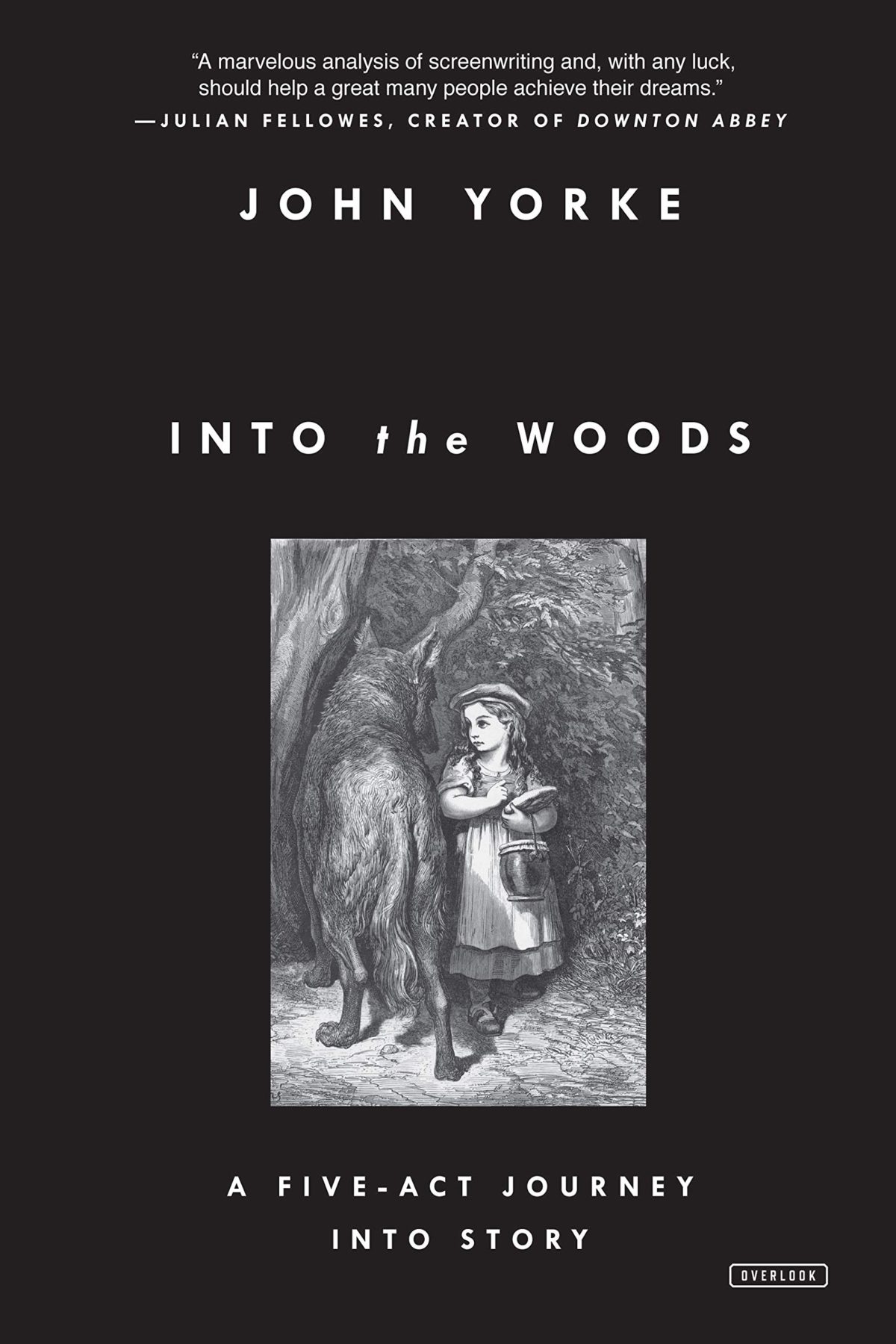
Leave a Reply